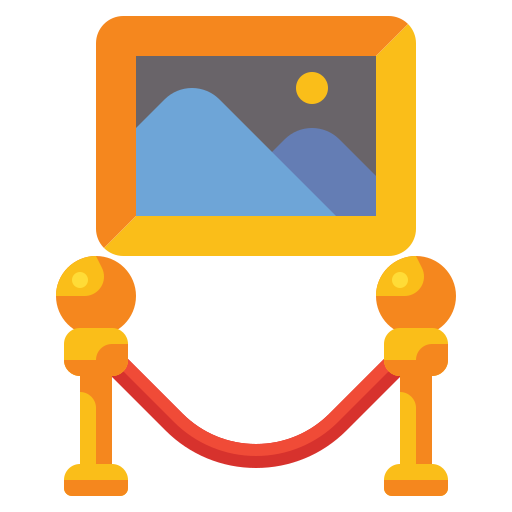 무제-97-10-5 / 정상화
무제-97-10-5 / 정상화
정상화는 1960년대에 정창섭, 박서보 등 실험성이 강한 동시대 젊은 작가들과 함께 앵포르멜 운동을 이끌어 갔다. 이 시기 작업들은 둥근 형태들과 표면의 재질감이 두드러진 추...
무제-97-10-5 / 정상화
291×218cm
회화
1997
정상화는 1960년대에 정창섭, 박서보 등 실험성이 강한 동시대 젊은 작가들과 함께 앵포르멜 운동을 이끌어 갔다. 이 시기 작업들은 둥근 형태들과 표면의 재질감이 두드러진 추상회화 작업이었다. 그러나 이후 일본 고베에서 작품활동을 하던 197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화면 전체를 규칙적인 네모꼴로 반복하여 구성하는 단색의 평면회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때로는 이 사각형의 단위를 가로지르는 사선이 결합되기도 하지만, 작가는 작은 네모꼴의 기본 단위가 모자이크처럼 화면 전체에 반복되는 화면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이러한 표면은 작가의 독특한 제작 방식에 의해 만들어진다. 먼저 고령토를 물과 섞어 캔버스 전체에 3?4mm 두께로 펴 바른다. 이 초벌이 마르면 캔버스 천을 틀에서 떼어내고, 뒷면에 가로, 세로의 규칙적인 선을 긋고 그 선을 따라 캔버스 천을 접어서 균열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다시 캔버스 천을 틀에 고정한 후, 갈라진 경계를 따라 사각형의 고령토 조각을 하나씩 떼어내어 움푹한 자리를 만든다. 이 공간을 다시 아크릴 물감으로 메워 나가는 작업을 반복하면, 균열을 따라 사각형의 독특한 공간이 반복되는 올 오버 회화가 탄생한다. 이처럼 작품의 제작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작가 자신이 이야기하듯이, ‘작품은 과정 자체로 끝이 나기’ 때문이다. 반복적인 과정 자체가 작품을 규정하는 정상화의 작업은 우리의 반복적인 일상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 화면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네모꼴이 어느 하나 크기나 부피가 같은 것이 없는 것은 똑같아 보이는 우리의 매일도 조금씩 다른 모습이며, 그 작은 차이들이 모인 것이 우리의 삶임을 은유한다. 그래서 정상화의 작품은 단일 색면으로 환원된 단순한 단색화가 아니라, 삶의 시간과 공간이 켜켜이 쌓여있는 장이다. 전반적으로 정상화의 단색 회화는 백색 계열이 주를 이루지만 〈무제 97?10?5〉(1997)와 같은 청색 계열의 작업도 다수 제작되었다. 감성적인 색조와 불규칙하게 균열된 틈에 의해 발생되는 명암은 단색조 평면 회화에 물리적, 서정적 변주를 극대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