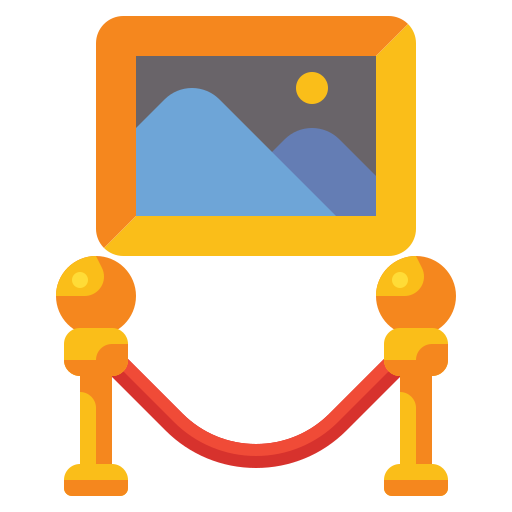 춤추는-상자-2006-153 / 김봉태
춤추는-상자-2006-153 / 김봉태
(2006)은 일상성에 주목하는 2000년대 중후반의 춤추는 상자 시리즈 중 하나이다. 상자들이 춤추는 듯 의인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
춤추는-상자-2006-153 / 김봉태
90×180cm
회화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