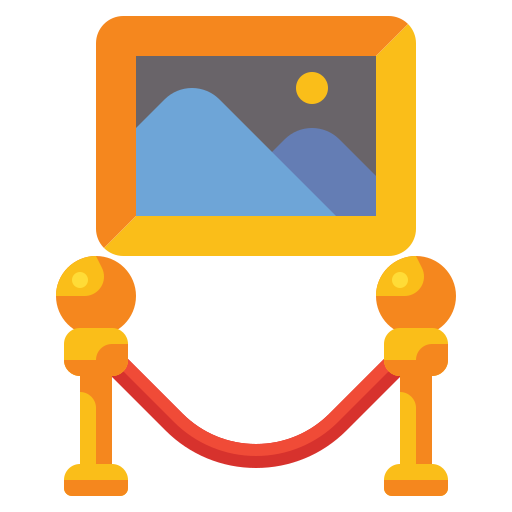 여기 / 이제
여기 / 이제
세 점으로 이루어진 <여기>(2010) 시리즈 중 한 작품이다. 각각 다른 크기의 캔버스에 제작된 세 작품은 공사가 진행된 철거의 현장, 불분명한 물건들이 뒤섞인 바닥, 한강...
여기 / 이제
72.5×90.8cm
회화
2010
세 점으로 이루어진 <여기>(2010) 시리즈 중 한 작품이다. 각각 다른 크기의 캔버스에 제작된 세 작품은 공사가 진행된 철거의 현장, 불분명한 물건들이 뒤섞인 바닥, 한강 고수부지라는 주변의 특별한 것 없는 풍경을 담았다. 세 작품에는 공통적으로 신체의 일부가 삽입되었다. 느닷없이 화면 전면에 등장하는 팔과 손, 맨 허벅지는 평범한 풍경 안에 난입하여 화면을 낯설게 만들고 감상자에게 심리적 긴장을 유도한다. 2010년 작가는 재개발의 현장을 목격하고 그 폭력적이면서도 아름답고, 충격적이면서도 희망이 담긴 기이한 풍경을 그리기로 결심했다. 기존의 재현적 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편집, 연출하고 보다 직관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양가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그렇기에 이 작품은 작가의 자화상이기도 하고 풍경화이기도 하다. 최민은 이제를 ‘적극적인 플라뇌즈(flaneuse)’로 칭한 바 있다. 그의 말대로 화가로서 이제는 성차(gender)의 구분이나 위계를 벗어나 자신의 독자적인 시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도시 공간을 관찰하고 그것을 작품 안에 고스란히 담아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