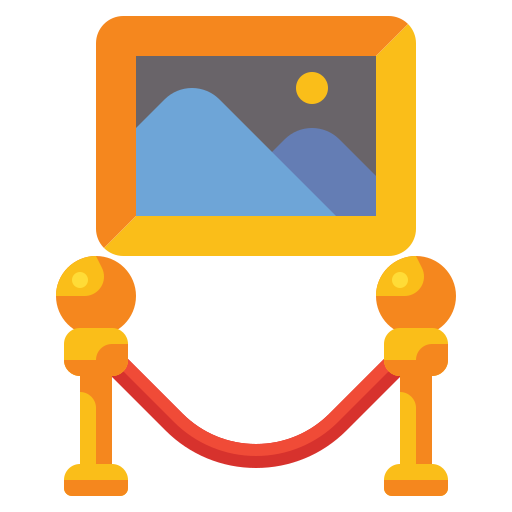 용마산 / 권순철
용마산 / 권순철
<용마산> 시리즈에서는 새롭고 신선한 것에서가 아닌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것들에 관심을 기울인 권순철의 작업태도를 엿볼 수 있다. 산은 인류의 그 어떤 것보다 오랜 세월...
용마산 / 권순철
51×115cm
회화
1984
<용마산> 시리즈에서는 새롭고 신선한 것에서가 아닌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것들에 관심을 기울인 권순철의 작업태도를 엿볼 수 있다. 산은 인류의 그 어떤 것보다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작가는 한국의 수많은 산을 직접 찾아다니며 그 형세를 화폭에 담아왔다. 해발 348m의 ‘용마산’은 서울과 경기도를 경계 짓는 아차산 줄기의 가장 높은 봉우리로, 그가 선화예고에 출강하며 매일 바라보던 곳이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그려진 용마산은 아름답고 웅장한 산세보다는 산의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있을 역사의 상흔을 보여주고 있다. 약 8년의 시차를 두고 그려진 세 점의 <용마산>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용마산>(1977)은 녹음이 우거진 푸르른 여름 산이 아닌 작가의 <얼굴> 작업과 유사한 어두운 색조와 거친 붓질로 이루어져있다. 미술비평가 장 루이 프아트뱅(Jean-Louis Poitevin)은 권순철의 “산에는 뼈가 있다.” 라고 평하기도 했는데, 에너지를 응집시킨 붓질로 겹겹이 쌓아올린 높은 밀도의 물감들은 자연의 운동감과 생동감을 화면에 집약시키면서 고독하고 강인한 산의 모습을 시각화 한다. 1984년과 85년에 각각 제작한 동명의 작품은 전작에 비해 파노라믹한 산의 형세를 보여준다. 두 작품은 같은 구도로 그려졌지만 서로 다른 빛깔을 발산하고 있어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을 관찰했던 작가의 작업태도를 엿볼 수 있다. 산의 형세는 채석으로 인해 허리가 휑하게 파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고 강인하게 표현되어있다. 당시 작가는 산과 함께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을 소재로 삼았는데, 커다란 상흔을 간직한 채 묵묵히 시대를 지나온 산은 한국 근현대사를 몸소 겪으며 꿋꿋하게 살아온 민중의 메타포이기도 하다. 동일한 산을 여러 해 반복적으로 그렸다는 점에서 그의 작업은 세잔이 그린 <생 빅투아르 산>(1904)과 비견되기도 하지만, 세잔이 산을 점차 추상적으로 표현하여 미술계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온 데 반해 권순철의 산은 개념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산이 가진 생명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작가의 작품 속 주요 소재인 얼굴, 산, 넋은 각각 별개로 자리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일관된 맥락을 이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