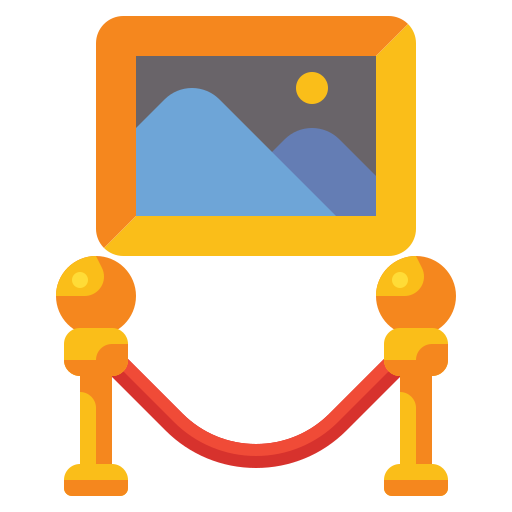 한국근대사-5 / 신학철
한국근대사-5 / 신학철
<한국근대사 5>(1982)에는 흑백의 모노톤으로 관능적인 입술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야수의 얼굴, 그리고 마치 신체 일부분에서 뚫고 나오거나 들어가려고 하는 다양...
한국근대사-5 / 신학철
71×66cm
회화
1982
<한국근대사 5>(1982)에는 흑백의 모노톤으로 관능적인 입술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야수의 얼굴, 그리고 마치 신체 일부분에서 뚫고 나오거나 들어가려고 하는 다양한 종류의 무기들이 엉켜있다. 일그러지고 녹아내린 몸뚱이 사이사이에는 온몸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작가는 작품의 뒷면에 자필 노트를 남겨놓았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현실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그는 무의식적 흐름에 따라 그린 덩어리 형상을 작금의 현실이자, 자기 자신으로 상정하고, 이를 두고 “분노도 느끼고 탄식도 하고 코끝이 시큰해”진다고 술회한다. 그러면서 작품 속의 형상이 점차 자기 자신도 알 수 없는 괴기한 덩어리로 변해가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토로하기도 한다. 하나씩 열거된 이름들은 극악무도한 만행으로 당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들의 실명으로, 초현실적인 이미지들의 결합 속에 녹아있는 실제 현실을 주지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