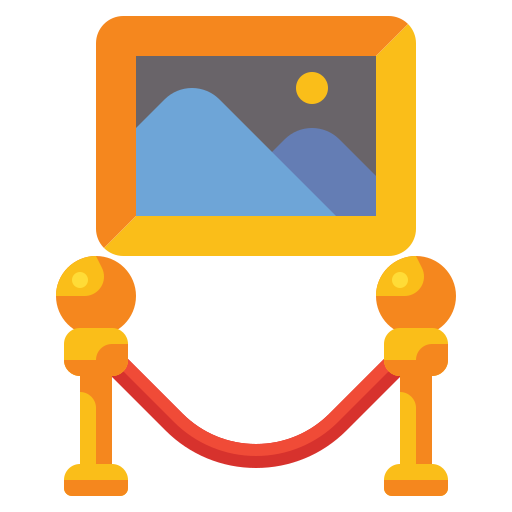 불사조 / 안창홍
불사조 / 안창홍
‘새’ 시리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주제는 고통과 죽음이다. 안창홍은 화살에 맞아 더 이상 비상할 수 없거나, 가시덤불에 걸려 몸부림칠수록 상처만 깊어지거나, 밧줄에 목이 ...
불사조 / 안창홍
123.5×184.5cm
회화
1985
‘새’ 시리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주제는 고통과 죽음이다. 안창홍은 화살에 맞아 더 이상 비상할 수 없거나, 가시덤불에 걸려 몸부림칠수록 상처만 깊어지거나, 밧줄에 목이 걸려 이내 죽음을 맞이할 것만 같은 새를 그렸다. 미술평론가 박영택은 “비상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그로테스크하게 보여주는 그의 그림솜씨는 단연 악마적”이라고 평했다. 여기서 새는 그의 자화상이자 분신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작가는 “새를 빌려 자신이 처했던 질식할 것 같은 공포와 죽음의 시대를 증언”한다. 1985-90년 사이에 제작한 <불사조> 시리즈는 죽음과 부활을 끊임없이 되풀이 하는 불멸의 새를 통해 시대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했던 작품이다. 목에 화살을 맞은 새는 죽음의 공포를 마주하며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다. 강렬한 붉은 색 바탕과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선명한 눈동자는 불사조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극대화하며 절체절명의 순간을 포착한다. 그러나 작가는 죽음을 절망의 순간으로 그리기보다 새로운 희망으로 해석하며 죽어가는 어미 새가 수많은 새끼로 환생하며 하늘로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같은 해에 제작된 또 다른 불사조는 푸른색과 검은색으로 교차된 모자이크 배경 속에 있다. 현실의 시공간을 왜곡하고 초월하는 공간 속에서 어미 새는 화살촉이 목에 꽂힌 고통을 삼키며 혼신의 힘을 다해 자신의 새끼들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극한의 상태에서도 붉은 눈을 부릅뜬 어미는 몸 안에 남은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새끼들의 입으로 흘려보내며 새롭게 피어나는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다. 이처럼 죽음의 문턱 앞에서 발휘하는 어미의 모성은 비극을 초월한 생의 의지를 극대화 하면서 절망의 끝에서 피어오르는 순결한 생명력을 전달한다. 안창홍은 생의 끝에서 빛나는 불사조를 통해 시대의 아픔으로 인한 숭고한 희생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임을 은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