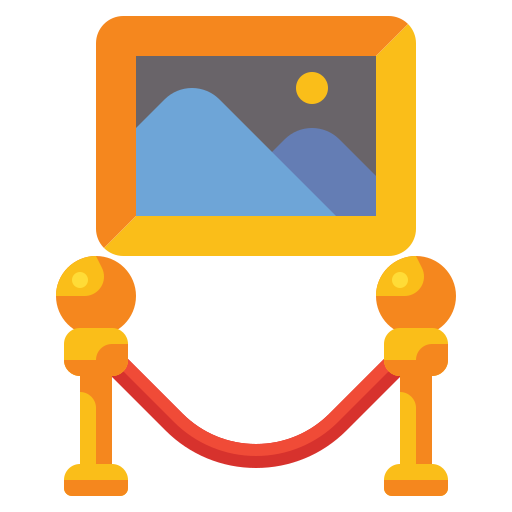 인체 / 오치균
인체 / 오치균
<인체> 시리즈는 뉴욕 유학 시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궁핍하고 비참한 생활을 했던 시기에 제작된 작품이다. 오치균은 아내에게 자신의 누드 사진을 찍게 한 후 그것을 재해석...
인체 / 오치균
126.5×96cm
회화
1989
<인체> 시리즈는 뉴욕 유학 시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궁핍하고 비참한 생활을 했던 시기에 제작된 작품이다. 오치균은 아내에게 자신의 누드 사진을 찍게 한 후 그것을 재해석한 형상을 캔버스에 담아냈는데, 어두운 방 안에 웅크린 나체의 인물에는 낯선 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두려움, 고독, 불안, 좌절 등의 감정이 투영되어있다. 두 점의 <인체>(1989)에 등장하는 볼이 움푹 들어간 남성은 오치균의 내면을 형상화한 자화상이다.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객관화하며 그린 이 작업에는 냉정함과 자기애를 넘나드는 복합적인 심정이 반영되어 있다. 온몸에 힘이 빠진 채 축 쳐져 있는 남성과 바닥으로 흐르는 아크릴 물감의 마티에르는 고된 생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작가의 상황과 심리를 시적으로 암시한다. 결국 그는 빈곤을 이기지 못하고 귀국하였지만, 역설적으로 이 시리즈는 그에게 성공적인 전시와 화단의 호평, 화랑과의 전속계약 등 작품 활동의 활로를 열어 준 고마운 작품이 됐다.
